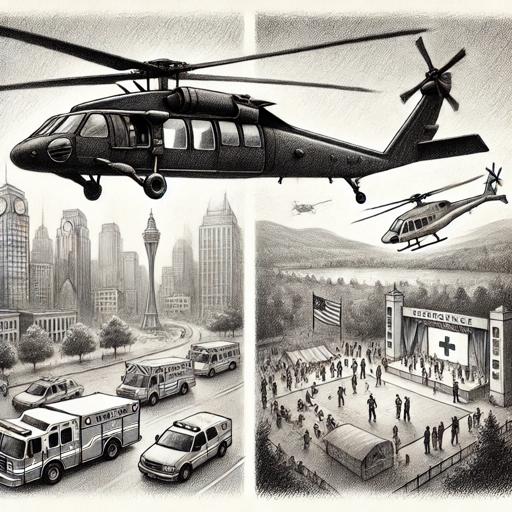
군용헬기가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때 전장의 상징이던 블랙호크 헬기가 이제는 수출과 리모델링, 민간사업까지 아우르는 사업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헬기 36대 성능개량 사업은 단순한 교체가 아닌, 국내 헬기산업의 지형을 바꿀 실험 같은 프로젝트다.
사업 규모는 약 9천억 원. 한 대당 제작비는 200억~250억 원에 달한다. 헬기 리모델링, 부품 공급, 성능 업그레이드까지 포함하면 시장은 수십 배로 확대된다. 현재 대한항공과 KAI가 경쟁에 뛰어들었고, 국산 헬기 수리온과 파생형 미르온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이들이 군을 넘어 해외 수출 시장에 진입하면 본격적인 ‘돈 되는 산업’이 열린다.
하지만 수출은 말처럼 쉽지 않다. 2013년, KAI는 수리온의 남미·동유럽 수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기술 부족이 아닌, 인증 미비와 현지 맞춤형 전략 부재가 발목을 잡았다. 유럽 항공안전기구(EASA) 인증이 없었고, 실전 운용 이력도 부족했다. 반면 터키는 자국 헬기를 공군이 먼저 안정적으로 운용한 뒤, 파키스탄·필리핀·나이지리아에 잇따라 수출하며 성과를 냈다. 수출은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보여준다.
군용헬기는 전쟁용으로만 쓰이지 않는다. 산불 진화, 응급환자 이송, 해양구조 등에도 쓰인다. 전투기처럼 무장을 앞세우는 무기가 아니라, 필요할 땐 환자를, 때론 소방수를 태우는 다목적 플랫폼이다. 기술적으로도 민수용 헬기보다 센서와 안정화 시스템이 많아 활용도가 높다.
미국에서는 실제 블랙호크가 코로나19 당시 백신 운반용으로 활용된 사례도 있다. 빠른 기동력과 저고도 접근성이 큰 장점이었다. 국내에서도 일부 군용헬기가 닥터헬기로 전환돼 산간지역 응급 이송에 투입된 바 있다. 헬기 한 대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순간, 무기와 산업의 경계는 흐려진다.
지난해 12·3 계엄사태 당시, 특전사 요원들이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직접 착륙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수도 한복판 국회의사당이라는 상징적 공간에, 그것도 야간 작전 형태로 헬기가 착륙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공중침투의 상징성과 충격, 당시 정치적 분위기까지 더해지며 블랙호크는 단순한 수송기가 아닌 '힘의 과시'를 상징하는 존재로 각인됐다. 바로 그 기체들이 이제는 산업 현장과 수출 무대 위를 날 준비를 하고 있다.
헬기는 아직 많은 사람에게 '낯선 기계'다. 특히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저공 비행 소음은 놀라움 그 자체다. 하지만 알고 보면 헬기는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다. 응급환자를 실어 나르고, 산불 현장을 누비며, 때론 무대 위 가수의 등장을 알리기도 한다. 방송 촬영용 헬기, 관광용 헬기, 그리고 국립공원 구조작전까지. 우리 삶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헬기 조종 체험 영상, 군사훈련 브이로그도 인기를 끌고 있다. 창밖 풍경, 진동 속 대화, 고도를 조절하는 조종사의 손길. 이런 장면들은 헬기를 새롭게 느끼게 만든다. 무기에서 돈 되는 산업으로,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교통수단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