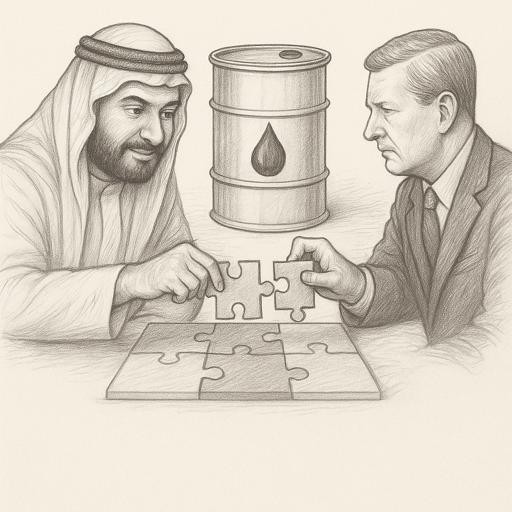
국제 유가가 다시 요동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OPEC+가 3개월 연속 석유 증산을 선언하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6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는 불과 넉 달 전보다 25%나 낮은 수준이다. 시장은 놀랐고, 석유 수출국들도 당황하고 있다. 감산 기조를 고수해 오던 사우디가 왜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무임승차자에 대한 응징’이다. 지난 3년 동안 OPEC+ 회원국들은 최대 600만 배럴의 감산을 단행했지만, 이라크와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는 이를 무시하고 할당량을 초과 생산해 왔다. 사우디는 자국의 감산 몫이 무려 200만 배럴에 이른다는 점에서, 내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증산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것이다.
다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효과적이다. 이번 증산 발표는 트럼프의 중동 순방을 앞둔 시점에 맞춰 나왔다는 점에서, 사우디가 향후 안보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움직임은 1980년대 이후 반복된 ‘사우디식 유가 전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사우디는 1986년, 1998년, 2014년, 2020년 총 네 차례에 걸쳐 공급 폭탄을 던지며 시장을 뒤흔들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경쟁 산유국을 견제하거나 OPEC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 지금도 같은 패턴이다. 다만 이번에는 지정학적 변수와 트럼프라는 ‘정치 변수’가 결합했다.
사우디가 이런 도박을 감행할 수 있는 배경엔 생산단가의 절대적 우위가 있다.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평균 생산원가는 배럴당 3.53달러. 모든 비용을 포함해도 10달러 안팎이다. 셰일오일 평균 단가가 45달러인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유가가 절반으로 떨어져도 사우디는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파급력이다. 미국 셰일 기업들은 신규 시추를 중단했고, 러시아는 전쟁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우디 역시 재정 균형을 위해선 최소 90달러 수준의 유가가 필요하다. 유가가 계속 60달러 안팎에 머문다면,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나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는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 증산은 경쟁국을 흔들기 위한 전략이지만, 결국 자신에게도 칼끝이 향할 수 있다.
실제로 사우디는 1분기 약 22조 원 규모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고, 미래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했던 네옴 프로젝트의 예산 축소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자원 부족으로 포괄적 검토에 착수했다”는 내부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이례적으로 조기 재검토에 나선 건 그만큼 유가 하락의 충격이 뼈아프다는 뜻이다.
한국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저유가로 인한 수입물가 안정,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석유 관련 산업의 수익성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이미 수출단가 하락과 재고 손실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러시아 등 저가 원유 의존도가 높은 업체일수록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S-Oil과 GS칼텍스 등은 이미 정제마진 감소로 인해 1분기 실적이 예년 대비 부진했고, 석유화학 업계도 글로벌 가격 하락 탓에 수출단가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정비 부담이 큰 정유업 특성상, 유가가 급락하면 단기 이익보다 재고 손실과 환율 부담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사우디는 단순히 산유국이 아니다. 자본시장과 안보 지형, 심지어 글로벌 정치 구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플레이어다. 이번 증산은 단순한 시장 대응이 아니라, 질서를 바로잡고 정치적 판을 짜려는 의도가 뒤섞인 다면적 행보로 봐야 한다.